1. 엉덩이가 헤진 교복 바지
문형배가 김장하 장학생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나까지 나서서 그것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떠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2019년 4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낡은 교복과 교과서일망정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서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라 했던 그 ‘낡은 교복’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까 한다.
어느 날 저녁을 겸해 술을 한 잔 하는 자리에서 그는 그 ‘낡은 교복’의 실체를 입에 올린 적이 있다. 중고등학생 때 엉덩이가 헤진 교복 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그게 창피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격한 공감의 웃음이 떠올랐다. 그가 먼저 하지 않았으면 내가 했을 수도 있는 이야기였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70년대 중·후반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이들은 엉덩이가 헤진 교복 바지가 전혀 낯설지 않다. 오히려 익숙하다. 안쪽에 색깔이 같은 천을 덧대고 재봉틀로 누덕누덕 누빈 그런 바지였다. 60명 남짓 되는 교실에서 많으면 절반 정도가, 적으면 3분의1이 그런 차림이었다.
1학년 1학기 신학기에 새 교복을 장만했어도 2학년 2학기 즈음이 되면 엉덩이가 헤져 있기가 일쑤였다. 문형배는 낡은 교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좀더 일찍 헤졌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헤져 있었을 것이다. 심하면 덧대고 누빈 천까지 헤지는 바람에 벌어진 틈 사이로 하얀 팬티가 비어져 나오기도 했다.
나는 부끄러워서 윗옷을 최대한 끌어내리고 책가방을 비스듬하게 뒤로 돌려 가리고 다녔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그런 교복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럭저럭 견딜 만했다. 그러나 교회나 성당 또는 도서관이나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에 가야 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난감했다.
그때는 교복 말고는 외출복이 없었다. 기껏해야 체육복이 고작이었고 고등학생이 되면 교련복이 추가되는 정도였다. 낯선 이들의 시선이 온통 엉덩이로 쏠리는 것 같았고 아는 여학생이라도 마주치면 얼굴이 절로 붉어졌다. 서로 더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문형배도 틀림없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지 싶었다.
2. 받는 것에 익숙지 못한
그런 그에게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은 메마른 가뭄에 쏟아지는 한 줄기 단비와 같았을 것이다. 비록 풍족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안정감은 주었을 것이고 그렇게 6년 동안 주어진 장학금을 바탕으로 삼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상당히 이른 시기인 대학 4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는 김장하 선생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올리고 “나는 이 사회의 것을 주었으니 내게 갚을 생각은 하지 말고 갚으려거든 사회에 갚아라”는 말씀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를 한시도 잊지 않았다. 좋은 법관이 되어 좋은 판결을 하는 것이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 여기고 평생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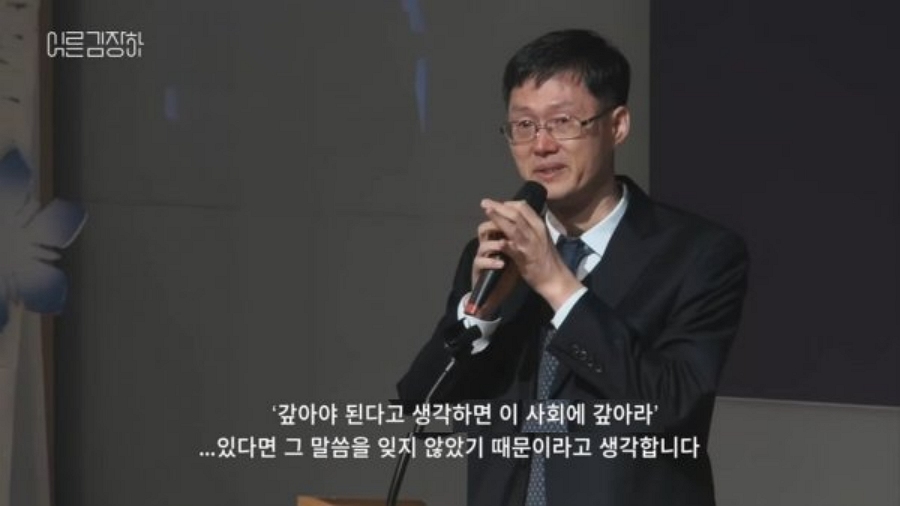
물론 그가 김장하 선생의 뜻을 좋은 판결로만 실현했을 것 같지는 않다. 김장하 선생을 닮아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낮고 추운 자리에 처한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며 도움을 준 적도 많을 것이고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기부한 금품도 적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부채의식’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누구나 고마워하고 갚으려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머리가 좋고 학교 성적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런 도움을 받아도 자기가 잘나고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고 생각하며 굳이 갚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들은 받는 것에 익숙하다. 남의 것을 받았으면서도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여긴다. 반면 문형배처럼 받는 것에 민감한 사람도 없지는 않다. 그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있으면 안절부절못하고 불안해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할 빚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
3. "법관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그의 부채의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대 상황에까지 이어져 있었다. 판사들이 지금 양심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재판하고 그래서 훌륭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판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때 그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조금 높아져 있었고 얼굴이 살짝 상기되어 있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에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에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4. 유치장 신세를 졌던 기억

그의 이런 부채의식은 오래전에 형성된 것 같았다. 대학 시절 경찰에 저항했던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런 기색이 느껴졌다. 도서관에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니 경찰이 교문에서 불심검문을 했다. 그런데 법전은 불심검문은 불법이라 가르치고 있었다. 앞에 나서서 데모는 못 할지언정 뻔히 알면서 불법에 순응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항의를 했다.
가슴에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 가득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다. 경찰은 ‘어라, 이것 봐라?’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연행되어 학교 앞 파출소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2시간 뒤 훈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자신의 이런 저항이 소소하다는 뜻으로 “물론 그 시절에 그렇게 잡혀갔다 풀려난 학생이 수만 명은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그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부드러운 판결로 유명하다. 어린 시절과 대학 시절에 겪었던 경험들이 여러모로 영향을 끼쳤음이 틀림없다. 그런 경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뼈저리게 겪은 가난과 고립감을 느꼈던 유치장이 피고인과의 역지사지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준 것은 사실이지 싶다. 그는 이처럼 모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내는 능력자다.
5. 나는 선을 넘었다
그와 얘기하다 보면 나는 어느새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졌다. 때로는 인생이 온통 고양되는 느낌까지 들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반듯한 시선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존재 조건과 그 삶의 가치에 대한 이해까지 두루 갖추고 있었다. 그는 취재를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사람이었다.
나는 선을 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자와 취재원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 원칙이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객관적인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나는 어느 날 불쑥 “우리, 친구 합시다” 했다. 그도 별로 망설이지 않고 “그럽시다, 까짓거” 했다. 그 뒤로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사귀는 20년 지기가 되었다.
'그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 달에 200 버는 친구가 한꺼번에 책 10권을 산 이야기 (1) | 2025.05.06 |
|---|---|
| 문형배 이야기 번외-경남도민일보 (0) | 2025.04.22 |
| 문형배 이야기 ⑦진심 (1) | 2025.04.19 |
| 문형배와 그의 헌법재판소가 세운 믿음 위에서 (1) | 2025.04.19 |
| 김건희는 왜 아직도 ‘여사’인가 (1) | 2025.04.19 |



